Fast Thinking 시대에 Slow Thinker가 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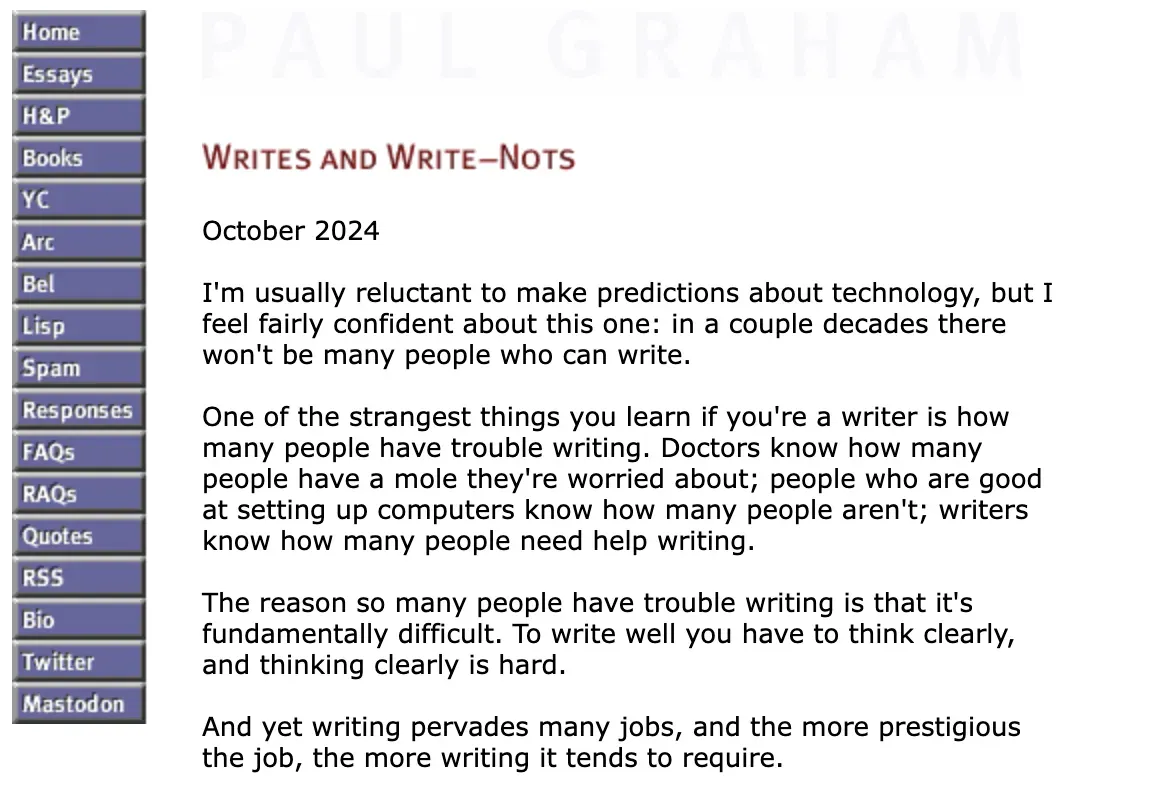
폴 그레이엄은 Y Combinator라는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만든 사람이다.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같은 회사들이 모두 여기서 시작했다. 프로그래머 출신인 그는 특유의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기술, 사회, 비즈니스에 대한 에세이들을 써왔다.
최근 그가 쓴 ‘Writes and Write-nots’는 AI 시대의 글쓰기와 생각하기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다. 그는 수십년 후면 사람들이 ‘글을 쓸 수 있는 사람’과 ‘쓸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뉠 것이라고 예측한다. AI가 대신 글을 써주는 시대가 오면서, 스스로 글을 쓸 줄 아는 능력이 더욱 희소해질 거라는 것.
특히 그는 ‘글쓰기는 곧 생각하기’라고 말한다. 글을 쓰지 않고 생각한다고 믿는 것은 착각일 뿐이라고. 결국 그의 예측은 미래 사회가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양극화될 것이라는 경고다.
하지만 사회가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뉠 거라는 예측은 새삼스럽지 않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부터 소위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개인화 추천 서비스’가 널리 퍼지면서, 사람들은 필터버블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졌다. 소셜 미디어 속 필터버블의 문제점을 다룬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가 나온 것이 벌써 4년 전이지만, 그동안 세상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기만 했다.
알고리즘이란 본래 컴퓨터가 따라 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전문 용어지만, 최근에는 ‘너가 관심있을 만할 것을 보여줄게’라는 의미로 쓰인다. 야구 영상을 몇개 보면 유튜브에 야구 관련 영상으로 가득 차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좋아하는 것을 계속 보여준다. 이건 마치 생각을 대신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무엇을 볼지 스스로 생각해서 선택하게 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준다. 편하고 좋은 기술인지도 모른다.
이 ‘알고리즘’에 의해, ‘필터버블’이 생겨난다. 마치 비눗방울에 갇힌 사람처럼, 개인화 필터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 이 필터버블은 결국 확증 편향을 강화한다. 내 생각이 맞다는 것만 계속 확인하게 되고, 깊이 생각해보거나 반문해볼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위험하다. 알고리즘과 필터버블은 결국 ‘생각하는 능력’을 소멸시킨다. 폴 그레이엄의 말처럼, 생각하는 사람의 종말이다.
나는 그 위험을 일찍 알아차렸다고 자부했었다. 4년 전 넷플릭스에서 <소셜 딜레마>를 보고 충격을 받아, 알고리즘의 개인화 추천을 하나씩 꺼나갔다. 유튜브의 추천 영상, 구글과 인스타그램의 추천 광고, 각종 앱의 푸시 알림까지. ‘내가 뭘 볼지는 내가 정하겠어’라는 다짐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나는 더 강력한 ‘생각의 대리인’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바로 생성형 AI다. 글을 쓸 때마다 AI와 대화하며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생각이 막힐 때마다 AI에게 새로운 관점을 요청한다. 때로는 이게 내 생각인지 AI의 생각인지 헷갈릴 때도 있다.
알고리즘의 추천을 거부했던 내가 왜 AI의 도움은 기꺼이 받아들였을까? 아마도 AI는 ‘대화’라는 형식을 통해 나의 생각을 확장시켜주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나는 AI에 설정하는 Instruction에 “내가 질문을 하거나 얘기할 때 적절히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 라는 규칙을 덧붙여 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생각을 대신해주는’ 또 다른 형태의 필터 버블은 아닐까?
마치 패스트푸드처럼, 알고리즘과 AI는 우리에게 빠르고 편리한 ‘생각의 패스트푸드’를 제공한다. AI는 빠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알고리즘은 편한 콘텐츠만 보여준다. 하지만 패스트푸드만으로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수 없듯이, Fast Thinking만으로는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없다.
AI와의 대화는 중독적이다. 1초 만에 긴 답변이 출력되는 UI는 마치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 지금도 이 글을 빠르게 완성하기 위해 AI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Fast Thinking의 유혹이다.
하지만 나는 몇 가지 규칙을 세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생각하기 시간’을 반드시 갖는 것이다. AI와 대화하기 전에, 예전처럼 종이와 펜을 들고 마인드맵을 그린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블로그에 기록해두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된 나의 생각을 기반으로 AI와 대화하면,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면서도 내 생각의 중심은 잃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준비가 필요한 이유는 AI와의 대화가 가진 특별한 성격 때문이다. AI와의 대화가 인간 대 인간과의 대화와 가장 다른 점은, AI에게는 자신만의 세계가 없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도 없고, 학창 시절 싸운 친구도 없다. 청춘의 시절을 함께 보낸 연애사도 없고, 대차게 실패하고 바닥을 치던 시기도 없다. 그저 무한한 데이터의 세계일 뿐이다. 이 점에서 독특한 역설이 발생한다. AI는 무한한 데이터의 세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무한함은 오직 우리가 공유한 맥락 안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AI는 내가 설명한 경험과 생각의 범위 안에서만 유의미한 대화를 할 수 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AI가 결국 나의 세계와 만나는 지점에서만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AI와의 대화가 결국 나와의 대화가 되는 이유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 ‘혼자만의 생각하기 시간’이다. 나는 7년째 꾸준히 회고 습관을 이어오고 있다. 주간 회고, 월간 회고, 분기 회고, 연말 회고까지. 이런 정기적인 회고를 통해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발전시켜왔다. 이렇게 축적된 나만의 세계가 있기에 AI와도 더 풍부한 대화가 가능한 것이다.
Fast Thinking을 도와주는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 Slow Thinking이 필요하다. AI는 우리의 생각을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잊지 말아야 한다. 폴 그레이엄의 예측처럼 미래가 ‘thinks’와 ‘think-nots’로 나뉠 때,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스스로의 생각을 믿고 키우는 것부터 첫걸음을 시작해보자.